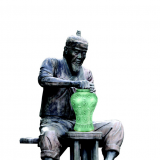벗어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중현 광주 증심사 주지
2022년 01월 07일(금) 02:00 가가
얼마 전부터 자주 호흡이 곤란해지곤 한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하는 기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호흡 곤란이었다. 인간은 육체적 감각을 기억하지 못한다. 사실만 기억할 뿐이다. 기억을 소환할 때 따라오는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다. 인간은 고통을 관념적으로만 가슴에 새긴다. 설령 죽음을 맛본 육체적 고통일지라도 기억의 창고에서는 다른 여타 정보들처럼 한낱 팩트에 불과하다. 최소한 나의 경우는 그렇다. 그런고로 망각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축복이자 저주이다.
다시 찾아온 호흡 곤란 증상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였다. 심근경색의 고통은 삶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서나 경험할 법한 것이다. 덕분에 심근경색의 고통은 내가 지금껏 살면서 경험한 숱한 육체적 고통 중 단연 최악이다. 다시는 그런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다. 중환자실 체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는 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수시로 배고픔의 고통이 밀려와도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정답이다.
우선은 오후 불식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운동량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서 좋아하던 커피도 끊었다. 건강한 심장이라면 하루 몇 잔의 커피는 도움이 될 수 있다지만, 병약한 심장은 커피의 자극이 버겁다.
호흡 곤란 증상을 타인에게 이야기하면 약속한 것처럼 돌아오는 말이 있다. “그거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눈에 띄는 외상이 아니라면, 몸이 아픈 고통을 타인이 공감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래, 저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야. 사실 지금 내가 비정상이지.’ 이렇게 말이다. 나를 이해해 달라고 고집부려 봐야 통하지 않음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호흡 곤란을 당하다 보니, 숨쉬기가 편안할 때면 미지의 어떤 존재에게 고마움 같은 감정마저 생기곤 한다.
호흡 곤란 증상 덕분에 일상도 제법 달라졌다. 오후가 되면 불식, 산책, 샤워를 매일 반복한다. 예전엔 일주일에 두어 번 정도였지만, 요즘은 날씨만 허락하면 거의 매일이다. 일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늦게 절에 들어와도 웬만하면 지킨다. 오후 불식을 한 달 이상 하니 식욕의 거의 대부분이 식탐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식탐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자 비로소 식탐이 보인 것이다. 덕분에 9시, 늦어도 9시 반이면 잔다. 계속 깨어 있자니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식탐의 유혹이 거추장스러워서 아예 자 버린다.
일찍 자니 일찍 일어난다. 2시 전후. 예전엔 이 시간에 깨면, 우주적 고독이 곰팡이처럼 어둔 방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곤 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고 그래서 언제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었다. 잠이 덜 깬 정신이 맞닥뜨려야 했던 정적과 고립은 확실히 깨어 있는 낮 동안 경험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였다. 깨어있는 동안엔 음악이 매우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시간의 음악은 아무리 작고 조용한 음악이어도 몹시 귀에 거슬린다. 그만큼 정적과 고요가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간에 엄습하곤 했던 우주적 고독은 일상적이지 않은 정적과 고립이 부담스러웠거나, 아니면 고요한 정적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집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이다.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평소라면 보지 못했을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매우 기이한 존재이다. 세상에는 거리를 두고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은 종종 홀가분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는 게 심심할 때 찾아오는 작은 선물이거나 아니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
우선은 오후 불식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운동량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여기에 더해서 좋아하던 커피도 끊었다. 건강한 심장이라면 하루 몇 잔의 커피는 도움이 될 수 있다지만, 병약한 심장은 커피의 자극이 버겁다.
눈에 띄는 외상이 아니라면, 몸이 아픈 고통을 타인이 공감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그래, 저 사람들의 생각이 정상이야. 사실 지금 내가 비정상이지.’ 이렇게 말이다. 나를 이해해 달라고 고집부려 봐야 통하지 않음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심지어 시도 때도 없이 불쑥 호흡 곤란을 당하다 보니, 숨쉬기가 편안할 때면 미지의 어떤 존재에게 고마움 같은 감정마저 생기곤 한다.
일찍 자니 일찍 일어난다. 2시 전후. 예전엔 이 시간에 깨면, 우주적 고독이 곰팡이처럼 어둔 방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곤 했다. 익숙하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힘들고 그래서 언제나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었다. 잠이 덜 깬 정신이 맞닥뜨려야 했던 정적과 고립은 확실히 깨어 있는 낮 동안 경험하기 힘든 또 다른 세계였다. 깨어있는 동안엔 음악이 매우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시간의 음악은 아무리 작고 조용한 음악이어도 몹시 귀에 거슬린다. 그만큼 정적과 고요가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시간에 엄습하곤 했던 우주적 고독은 일상적이지 않은 정적과 고립이 부담스러웠거나, 아니면 고요한 정적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집착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이다.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평소라면 보지 못했을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또렷하게 보이는 매우 기이한 존재이다. 세상에는 거리를 두고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것은 종종 홀가분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는 게 심심할 때 찾아오는 작은 선물이거나 아니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소중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