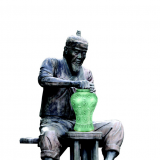[수필의 향기]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김향남 수필가
2022년 12월 12일(월) 00:45 가가
A는 중학교 때 친구다. 그녀는 야구팬이었다. 야구를 좋아하는지 야구 선수를 좋아하는 것인지 확실치는 않았지만, 하여튼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줄곧 TV 앞을 지켰다. 그녀를 따라 난생처음 팬레터라는 것을 써 보게 되었다. 뭐라고 썼는지, 그 편지를 부쳤는지 안 부쳤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문방구에 들러 편지지를 고르고 빈 교실에 앉아 하얀 종이를 채워 가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다. 스스로 팬임을 자처하며 열렬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던 일은 쑥스럽기는 했으나 그보다 훨씬 크고 뿌듯한 마음을 안겨 주었다.
A는 독서광이기도 했다. 그녀를 따라 ‘데미안’을 읽었고, ‘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었고 ‘죄와 벌’을 읽었다. ‘부활’을 읽었고 ‘좁은 문’을 읽었고 ‘이방인’을 읽었다. A의 노트에는 많은 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노트에서 ‘국화 옆에서’를 읽었고 ‘꽃’을 읽었고 ‘미라보 다리’를 읽었다. ‘세월이 가면’을 읽었고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를 읽었고 ‘애너벨리’를 읽었다. 그녀의 노트를 베껴 쓰거나 나만의 노트를 만들면서 푸른 꿈을 꾸던 시절이었다.
B는 앞집에 살았다. 그녀를 따라 가수 P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래도 기꺼이 따라나섰다. 구경이란 언제나 낯설고 신기한 선물을 가득가득 안겨주곤 하니까. P는 부드러운 미성에 말끔하게 잘생긴 청년이었다. 사람들은 P의 노래를 따라 물결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휙휙 휘파람을 불기도 했다. 모두가 오직 한 사람에 도취한 듯 뜨거운 함성을 질러대는 특별한 밤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도 닫혔다. 사람들은 어느새 무대 뒤로 몰려가 P의 주위를 둘렀다. B 역시 무대 뒤로 쫓아가 P를 좀 더 가까이 알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얼떨결에 나도 바로 목전에서 P의 얼굴을 보았다. 팬들에 둘러싸인 그의 웃음에 왠지 모를 피로감이 느껴졌다. 그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다. 돌아오는 차안, ‘최애’하는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즐긴 B는 싱글생글 연신 행복한 얼굴이었다.
C는 Y의 팬클럽 회원이었다. 노래방에 가면 Y의 노래만 불렀다. 목소리도 폼도 똑같이 빼닮은 그는 영락없는 Y의 아바타였다. 그에게 가수란 처음도 끝도 Y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Y의 노래를 들으면 살맛이 난다고 했다.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견딜 만한 힘이 생겼다. 꽃 피는 동백섬이건 그 겨울의 찻집이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건 그의 노래를 들으면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두근댄다고 했다.
엊그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좋아하는 작가 한 사람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건 그가 게으르거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분의 주장인즉 글쓰기는 혼자서 하더라도 서로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왠지 나를 겨냥한 듯싶어 뜨끔 놀랐다. 멀찍이 떨어져 구경이나 하는 본새가 영 아니올시다 싶은지도 몰랐다. 이어서 떠오른 한 구절.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안도현)는 이 시는 내 머릿속에도 자동 인식되었을 만큼 널리 회자되는 명예를 얻었지만, 읽는 마음을 모두 편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명령과 ‘너는’이라는 콕 집은 호명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꾸짖음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허물을 상기하여 들추게 하고, 나아가 올바로 살기를 종용하는 저 높은 곳의 음성처럼, 엄격하고 근엄한 저 경구의 위상으로부터 마음의 안위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묻게 된다. 너는 자신과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 혹은 일과 일터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로 뜨거움(사랑)을 실천해 보았느냐. 우리의 삶은 저 A와 B와 C 들의 열망으로 면면히 흘러왔거늘, 저들과 더불어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식은 화로처럼 자꾸 냉랭해지는 자신에 대하여 다시금 죽비를 들어 본다. 누군가를 향하여 열성을 다해 팬레터를 써 보고 싶은 마음으로….
C는 Y의 팬클럽 회원이었다. 노래방에 가면 Y의 노래만 불렀다. 목소리도 폼도 똑같이 빼닮은 그는 영락없는 Y의 아바타였다. 그에게 가수란 처음도 끝도 Y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Y의 노래를 들으면 살맛이 난다고 했다. 쓸쓸하면 쓸쓸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견딜 만한 힘이 생겼다. 꽃 피는 동백섬이건 그 겨울의 찻집이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건 그의 노래를 들으면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두근댄다고 했다.
엊그제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좋아하는 작가 한 사람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건 그가 게으르거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분의 주장인즉 글쓰기는 혼자서 하더라도 서로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왠지 나를 겨냥한 듯싶어 뜨끔 놀랐다. 멀찍이 떨어져 구경이나 하는 본새가 영 아니올시다 싶은지도 몰랐다. 이어서 떠오른 한 구절.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너에게 묻는다’(안도현)는 이 시는 내 머릿속에도 자동 인식되었을 만큼 널리 회자되는 명예를 얻었지만, 읽는 마음을 모두 편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명령과 ‘너는’이라는 콕 집은 호명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꾸짖음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허물을 상기하여 들추게 하고, 나아가 올바로 살기를 종용하는 저 높은 곳의 음성처럼, 엄격하고 근엄한 저 경구의 위상으로부터 마음의 안위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묻게 된다. 너는 자신과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 혹은 일과 일터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실로 뜨거움(사랑)을 실천해 보았느냐. 우리의 삶은 저 A와 B와 C 들의 열망으로 면면히 흘러왔거늘, 저들과 더불어 조금 더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식은 화로처럼 자꾸 냉랭해지는 자신에 대하여 다시금 죽비를 들어 본다. 누군가를 향하여 열성을 다해 팬레터를 써 보고 싶은 마음으로….